전체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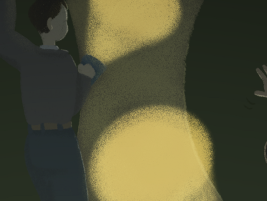
- 가와타 후미코와 나의 접점을 되돌아보다
-
가와타는 그저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대변하려고 했다. 공감하려는 자세가 있었기에 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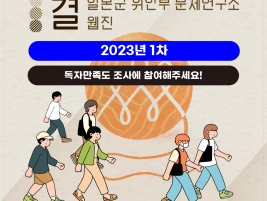
- 2023년 제1차 웹진 〈결〉 독자만족도 조사
-
조사 기간: 2023.6.14.(수) ~ 7.5.(수)
-

- 당신은 잘 해냈단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요?
-
19대 필리핀 의회와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가 유엔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를 고대하며, 지금까지도 필자와 제자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글로벌 정의 실현 운동과 관련한 필리핀 관료들의 지식, 태도 및 실천적 행동을 주제로 인터뷰를 지속하고 있다.
-

- 피, 땀, 눈물: 일본군‘위안부’ 풀뿌리 운동사의 흔적을 매만지며 〈3부〉
-
〈관부재판과 끝나지 않은 Herstory〉 전시가 탄생하기까지는 대학원생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존재했다. ‘연구보조원’이나 ‘조교’라는 이름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삶과 연구자 정체성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김효영, 민경택, 장찬영 씨를 청년좌담에서 만나 보았다.
-

- 피, 땀, 눈물: 일본군‘위안부’ 풀뿌리 운동사의 흔적을 매만지며 〈2부〉
-
〈관부재판과 끝나지 않은 Herstory〉 전시가 탄생하기까지는 대학원생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존재했다. ‘연구보조원’이나 ‘조교’라는 이름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삶과 연구자 정체성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김효영, 민경택, 장찬영 씨를 청년좌담에서 만나 보았다.
-

- 피, 땀, 눈물: 일본군‘위안부’ 풀뿌리 운동사의 흔적을 매만지며 〈1부〉
-
〈관부재판과 끝나지 않은 Herstory〉 전시가 탄생하기까지는 대학원생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존재했다. ‘연구보조원’이나 ‘조교’라는 이름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삶과 연구자 정체성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김효영, 민경택, 장찬영 씨를 청년좌담에서 만나 보았다.
-

- 일본군의 중국 여성에 대한 잔혹행위 기록하기
-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여성 강간이 여전히 무력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위안부’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일은 중요하다.
-

- 약하고 낮고 투박하지만 - 박숙이 생애사 연구
-
박숙이 할머니처럼 지방에서, 단독 주거 형태로, 90을 넘긴 늦은 나이에 피해자임을 밝힌 할머니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남을 것인가?
-

- 기억의 바다를 넘어서 - 관부재판이 1990년대 일본 사회에 물었던 것
-
서로 다른 역사성 사이에서 공감의 길을 찾던 과정, 관부재판의 법정은 바로 그 현장이었다.
-

- 원폭 피해자들은 왜 ‘유령’이 되었나 – 사진작가 김효연 인터뷰
-
개인의 역사는 곧 가족의 역사이자 한 국가의 역사다. 김효연 작가는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 갖게 된 ‘의문’에서 그치지 않고 작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물론 그 길로 가기까지 쉽지 않았다. 작업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때때로 엄습하는 두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렇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작업은 〈감각이상〉으로 세상에 공개됐다.